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 수준에 불과했던 전 세계 전기차 비중은 올해 13%까지 올라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속성장의 배경은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과 함께 완성차 시장양대산맥인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올인 정책에 힘입었다.
특히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과 같이 친환경차 패권을 쥐기 위해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 질서를 의미한다.
미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해석은 꽤 설득력이 있다. 미국은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고안한 대량 생산 시스템에 힘입어 1910년대부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맹주로 군림했다. 이후 GM과 포드, 크라이슬러의 견고한 빅3 체제가 형성되면서 무려 80년에 이르는 1위 독주 시대를 보냈다. 명예회복을 위한 절치부심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중국도 매한가지다. 팍스 아메리카나를 허물 유일한 대항마를 자처했지만 제조업의 꽃인 자동차 산업을 쥐지 못하면 1인자는 한낱 꿈에 불과할 뿐이다. 때마침 친환경 이슈로 급부상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의 포기를 정당화할 매력적인 명분이다. 잘만하면 전 세계 자동차 패권까지 쥘 수 있으니 정부 차원의 집중투자가 이뤄지는 건 당연지사다.
문제는 양국의 이러한 이해구도가 국지전이 아닌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 IRA가 포문을 열자마자 유럽은 전기차 ‘배터리 여권제’를 언급하며 맞불을 놓을 채비다. 배터리 여권제는 ESG 성과, 배터리 제조이력, 성능 업그레이드 이력, 재활용 데이터 제시 등 신뢰할 수 있는 배터리만 구입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질적으로 자국 내 배터리를 우선 구입하겠다는 자국 우선주의를 바닥에 깔고 있다.
최근에는 니켈과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와 호주까지도 광물자원을 매개로 카르텔 결성에 나섰다. 어쩌면 산유국 모임인 OPEC에 버금가는 신자원 민족주의 카르텔까지 등장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국이자 매장국이며 호주는 전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이다. 이들의 카르텔 결성은 전기차 공급망의 단순한 지형변동이 아닌 산업 자체를 흔드는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전기차를 둘러싼 맹렬한 변화에 우리의 미래차 산업 현주소는 어떨까. 이번 IRA에서 드러난 것처럼 뒤늦은 대처에 허둥지둥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2022~2026년까지 총 2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300조원에 이르는 돈을 미래차 연구개발(R&D)에 쏟아붓지만 우리는 이에 필적할 만한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은 급변하는 흐름에 기민하게 반응한 저력이 있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노키아와 모토로라, HTC가 단번에 몰락의 길을 걸었어도 우리 기업들은 시장 생존에 성공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미래차 산업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다시 한 번 저력을 발휘하길 기대해본다. 정부의 방향제시와 당근책, 그리고 산업 주체들의 부단한 실행력이 맞물리는 등 길지 않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과 같이 친환경차 패권을 쥐기 위해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 질서를 의미한다.
미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해석은 꽤 설득력이 있다. 미국은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고안한 대량 생산 시스템에 힘입어 1910년대부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맹주로 군림했다. 이후 GM과 포드, 크라이슬러의 견고한 빅3 체제가 형성되면서 무려 80년에 이르는 1위 독주 시대를 보냈다. 명예회복을 위한 절치부심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중국도 매한가지다. 팍스 아메리카나를 허물 유일한 대항마를 자처했지만 제조업의 꽃인 자동차 산업을 쥐지 못하면 1인자는 한낱 꿈에 불과할 뿐이다. 때마침 친환경 이슈로 급부상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의 포기를 정당화할 매력적인 명분이다. 잘만하면 전 세계 자동차 패권까지 쥘 수 있으니 정부 차원의 집중투자가 이뤄지는 건 당연지사다.
최근에는 니켈과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와 호주까지도 광물자원을 매개로 카르텔 결성에 나섰다. 어쩌면 산유국 모임인 OPEC에 버금가는 신자원 민족주의 카르텔까지 등장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국이자 매장국이며 호주는 전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이다. 이들의 카르텔 결성은 전기차 공급망의 단순한 지형변동이 아닌 산업 자체를 흔드는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전기차를 둘러싼 맹렬한 변화에 우리의 미래차 산업 현주소는 어떨까. 이번 IRA에서 드러난 것처럼 뒤늦은 대처에 허둥지둥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2022~2026년까지 총 2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300조원에 이르는 돈을 미래차 연구개발(R&D)에 쏟아붓지만 우리는 이에 필적할 만한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은 급변하는 흐름에 기민하게 반응한 저력이 있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노키아와 모토로라, HTC가 단번에 몰락의 길을 걸었어도 우리 기업들은 시장 생존에 성공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미래차 산업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다시 한 번 저력을 발휘하길 기대해본다. 정부의 방향제시와 당근책, 그리고 산업 주체들의 부단한 실행력이 맞물리는 등 길지 않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김상우 산업부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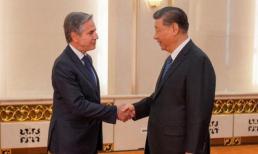






![[포토] 석촌호수에 나타난 포켓몬 라프라스와 피카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6/20240426155410280572_388_136.jpg)
![[포토] 악수하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6/20240426003606867599_388_136.jpg)
![[포토] 최정, 한국 야구 역사 468호 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4/20240424232935147850_388_136.jpg)
![[슬라이드 포토] 성수동이 들썩! 입생로랑 뷰티 팝업 방문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4/20240424184737983118_388_13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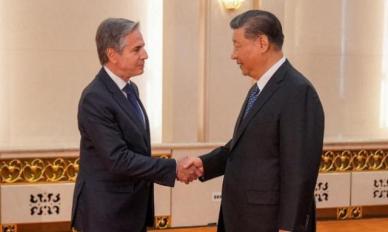

![[금투세 폐지 논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韓증시 불확실성 높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03/20240103150426112900_388_136.jpg)
